
사물인터넷으로 세상이 스마트해지고 있는 마당에 이제 만물인터넷까지 거론되고 있다.
사물인터넷과 만물인터넷으로 삼라만상이 인터넷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사물인터넷 시대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살아온 이전 시대와 변별된다. 사물인터넷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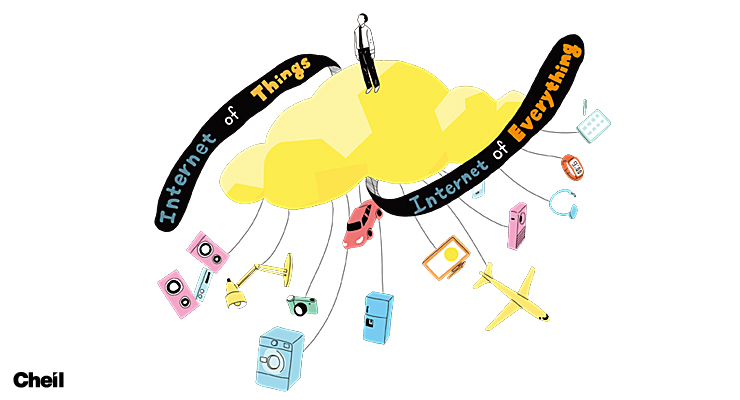
기계와 기계의 대화
침대가 깊은 잠과 얕은 잠을 반복하는 A씨의 수면 패턴을 파악해, 얕은 잠에 빠졌을 때 알람시계에게
“A를 지금 깨워”라고 알려준다. A는 부드럽게 속삭이는 알람 소리에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간다.
냉장고 스크린에는 “지난 주말 산 사과를 오늘까지는 드셔야 해요”라는 메시지가 나타나 있다.
냉장고가 사과 포장지에 있는 신선도 유지 기간 정보를 읽은 덕분이다.
A는 사과를 깎으며 커피를 내린다. 커피머신에 전원을 넣자 “새 원두를 주문할까요?”라는 화면이 냉장고에 나타난다.
원두가 이번 주 다 떨어지게 생겼는데, 마침 단골 커피숍에서 어제부터 원두 가격 할인을 시작했다.
커피머신은 냉장고에게 하루에 6번씩 커피 가격 정보를 A의 단골 커피숍 홈페이지를 통해
파악해 달라고 부탁했고, 냉장고는 어제 오후 시작된 할인 정보를 놓치지 않고 기록해 놓았다.
윗글은 5년 뒤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아침 풍경이다. 하지만 사실 5년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싶다.
이른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트렌드가 어느새 우리 주변으로 성큼
다가왔으니 말이다. 이미 하루 종일 몸에 지니고 다니는 전천후 센서인 스마트폰은 우리의 정보를
수많은 다른 사물들에게 알려주고, 다른 사물의 정보를 건네받으면서 우리를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 속에 던져 놓았다.

미국의 대형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시스코는 이런 변화의 속도가빨라지자 사물인터넷이라는 표현 대신 아예 ‘만물인터넷
(Internet of Everything)’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주위의
모든 전자기기들이 인터넷 연결 기능을 갖추고, 사람의 매개없이
다른 기계와 통신을 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일컫는 말이다.
사실 기계 간 통신은 예전부터 흔히 볼 수 있었다. ‘스마트 키’라고
불리는 신형 자동차에서 일반화 된 열쇠는 운전자가 가까이만 와도 불을 켜주고 문을 열어주며, 각종 편의장치를 미리 작동시킨다.
전자태그(RFID) 기술의 발달 덕분에 매장 직원이 감시하지 않아도 경보장치가 계산되지 않은 제품을 들고 나가는 소비자를 살피고는 경보를 울려 준다. 지갑에서 매번 현금을 꺼내지 않아도 교통카드를 지갑이나 핸드백에 넣어둔 채 전철과 버스를 타는 건 기본이다.
이런 식의 통신은 기계와 기계 사이의 대화였다.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 기계끼리 서로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게
특징이다.
▲벤처기업 센스(Sen.se)의 홈 모니터링 시스템. 납작한 쿠키 모양을 한 모션 쿠키를 가방, 침대, 알약, 칫솔 등 집 안에 있는 사물에
부착하면 이동, 기온, 운동량 등 다양한 데이터를 인형처럼 생긴 센스마더에 계속 전달한다. 이상 데이터 발생시 센스 마더가 반응한다
(출처: https://sen.se)
기계와 인터넷의 대화
그런데 이런 사물 간 통신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건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때문이었다.
초창기의 인터넷은 순수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었다. 물론 그 사이에 컴퓨터라는 기계와
이를 이어주는 통신망이라는 구리선이 있기는 했지만, 인터넷을 타고 흐르는 정보는 대부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정신활동의 소산이었다. 글을 쓰는 것도 사람이고, 그 글을 읽고 행동을 바꾸는 것도
사람이었다.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이 주고받는 문자가 데이터가 됐고, 그림과 영상 등이 됐다.
그리고 이런 정보는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고 현실에 영향을 줬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사람에겐 ‘쉬어야 하는 동물’이란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종전까지는 집에 불이 났다면
화재를 본 사람이 인터넷이나 전화로 이를 알려줘야만 집 밖에 있는 집주인이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 무슨 문제냐 싶겠지만, 인터넷 시대엔 아니다.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바로 스마트폰을 갖고 외출한 집주인에게 화재경보를 울려주고,
집 안 상황을 CCTV로 전송하면서 119에 화재신고를 해주는 게 오히려 이 시대엔 당연한 것이 됐다.
이런 새로운 표준을 위해 사람들은 ‘쉬지 않는 인터넷’을 만들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자동차 소모품을
교체할 시기가 다가오면 운전자가 알아서 서비스센터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차가 서비스센터에
인터넷을 통해 점검 상황을 알리고, 차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회사에서 고객에게 서비스센터 방문을 요청하는
전화를 건다.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사람보다 훨씬 자주 데이터를 모은다.

사물인터넷이란 말을 오늘날의 의미로 처음 사용한 사람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오토ID 센터의 캐빈 애시턴이었다.
그는 2009년 에 기고한 ‘사물인터넷이라는 것(That ‘Internet of Thing’s Thing)이란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문제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시간과 집중력, 정확함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현실 세계로부터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영 별로다. 그리고 그게 바로 문제다. -중략- 오늘날의 정보기술은
사람들이 먹고 움직이면서 쌓아놓은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다.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다.
만약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일은 컴퓨터에게 시키고 우리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 아이디어만 낼 수 있다면
낭비를 줄이고 효율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개별 기계 단위로 만들어지고 사라졌던 모든 데이터가 이제는 인터넷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다른 기계가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는 이런 새로운 트렌드의
집대성이라 할 만했다. 인텔은 유아복에 센서를 달아 부모가 커피를 마시는 컵에 아이의 체온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도록
돕는 모습을 선보였다. 팔목에 차고 개인의 운동량을 측정해 주는 스마트 밴드는 거의 모든 제조사가 새로 만들었고,
테니스 라켓에 센서를 달아 매번 공을 칠 때마다 스트로크의 정확도와 스핀, 스피드를 분석해 주는 스마트 라켓도 나왔다.

적절한 양치 습관을 조언해 주는 스마트 칫솔, 수면 상태를 분석해 주는
스마트 침대, 자동차끼리 통신해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속도를 조절해
충돌 위험을 줄여주는 차량 간 통신. 예를 들기도 끝이 없을 정도다.
이 모든 기계의 특징은 하나다. 어떤 기계도 사람에게 바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든 데이터는 일단 인터넷으로 보내진다. 그리고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의해 데이터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석된다. 사람은 이렇게 해석된 최종 데이터를 본 뒤 양치 습관을
바꾸거나 스윙을 조절할 뿐이다. 판단도, 조언도 기계가 하는 세상이다.
사람들은 해석의 방법만 만들어 기계에게 지시한다.
◀프랑스 업체 콜리브리(Kolibree)에서 선보인 전기 칫솔. 센서가 내장돼
있는 이 칫솔은 양치 시 칫솔질 움직임, 치석 제거율 등의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전달한다 (출처: kolibree.com)
사물인터넷의 아이러니
이런 사물 인터넷 시대의 또 한가지 특징은 소형화다. 사물 인터넷의 핵심은 기존 사물의 움직임이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자세하게 측정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물 인터넷을 위한 센서는
라켓에 달려도 테니스 선수가 기존 라켓과 차이를 느낄 수 없을 만큼 가볍고 튼튼해야 하고,
아이의 옷에 달아도 건강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적은 전류와 전파를 사용해야 한다. 최근의 기술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셀프 러닝 기능을 갖춘 네스트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파악해
실내 온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원격 조종도 가능하다
(출처: nest.com)
저전력 블루투스 기술이라 불리는 블루투스 4.0 기술은 아주 적은 전력을 통해 데이터를 주위 기계와 주고 받는다.
애플은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아이비콘(iBeacon)이라는 기술 규격을 만들었는데,
아이폰 같은 애플 기기와 주변의 수많은 센서가 데이터를 주고받게 하는 사물인터넷 기술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매장을 걸어 다니는 소비자의 움직임을 측정해 오래 멈춰선 상품 앞에서
해당 상품의 할인 정보를 아이폰으로 띄워주는 일 등이 가능해진다.
“그거 싸니까 사보세요. 더 깎아 드릴게요”라는 말은 이제 점원의 대사가 아니다.
이런 말은 이제 기계가 기계의 판단으로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형화된 사물 인터넷은
기존에 추적되지 않았던 공간에서 추적할 수 없었던 움직임까지 추적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물인터넷의 시대는 이전의 시대와 또 한 차례 다른 시대라고 말한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바로 예외의 문제다. 사물인터넷의 꽃은 데이터다. 사람이 일상생활을 통해 만들어 내는 수많은 데이터 이야기다.
사물인터넷은 이렇게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각각의 데이터를 살핀 뒤 평균값을 판단한다.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 결정을 내린다. 즉 100% 완벽한 선택은 애초에 할 수도 없고, 50% 불완전한 선택보다는
더 나은 결정을 하는 게 이른바 ‘빅데이터’를 이용해 결정을 내리는 사물인터넷의 특징이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모든 게 어느 정도 괜찮은 단계로 수렴된다.
탁월함은 이상 신호고, 아웃라이어는 버려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현실의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해
현실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사물인터넷의 결혼이 이렇게 된다는 건 아이러니다.
현실은 예외와 아웃라이어로 가득 차 있고, 그런 예외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실제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진화가 돌연변이에서 일어나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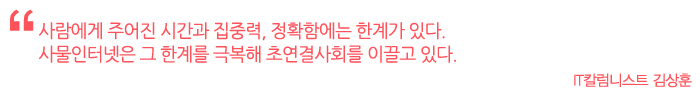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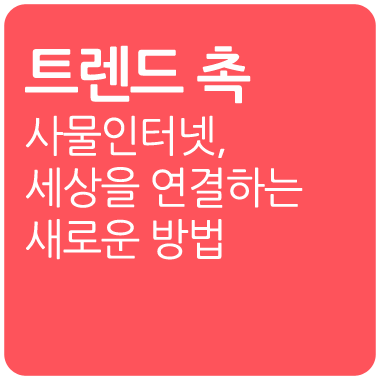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