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싫어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Cheil Magazine 2018. 3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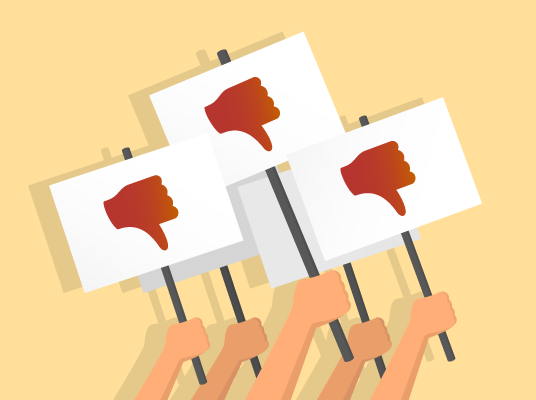
소개팅 자리에서 서로 마주 앉은 남녀 사이에 이런 말이 오고 갑니다. 영화 좋아하세요? 클래식 좋아하세요? 야구 좋아하세요? 마치 취향 목록을 작성하기라도 하려는 듯 좋아하는 것에 대한 연쇄 질문이 이어집니다. 아마도 그 기저에는 ‘취향에 대한 이야기가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 주고, 상대를 빨리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걸 묻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는 왜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질문하지 않는 걸까요? ‘취향 = 좋아하는 것’이라는 공식이 머릿속에 똬리 틀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사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취향(趣向)이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을 뜻합니다. 영어로 표현했을 때도 ‘Taste’, ‘Liking’, ‘Preference’처럼 좋아하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나 체감적으로 보면 취향에는 분명히 ‘하고 싶은 것’ 못지않게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속해 있지요.
르누아르의 그림 속에 나오는 여인들도 아름답지만, 황재형의 캔버스에 등장하는 광부의 초상에서도 숭고한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미(美)’가 단지 표면적인 황금 비율만이 아니듯 취향 역시 그러합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남들이 다 짜장면을 시킬 때 “싫어, 난 짬뽕!”이라고 말하면 까탈스러운 사람으로 취급됐지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전부 싫다고 말할 때 혼자서 “난 좋아!”라고 말하면 눈칫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저 호불호를 말했을 뿐인데 불만이 많거나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으로 폄하됐지요. 우리는 오랫동안 평균적인 것에, 대세에 순응하도록 종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호불호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싫존주의’의 시대입니다. 남들이 좋아해도 내가 싫으면, 남들이 싫어해도 내가 좋으면 그게 나만의 ‘가치’이고, 그러한 나만의 가치가 매우 중요해진 세상입니다.

『Cheil』 매거진은 지난 2월호에서 ‘Convince’라는 키워드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얻은 가짜가 소비자의 마음을 어떻게 설득하는지 살펴봤습니다. 3월호의 키워드는 ‘Contend’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건 ‘My Way’를 주장하며 자신만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경향에 대해 짚어 보고 있습니다.
‘Convince’와 ‘Contend’ 사이에는 의식의 전환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세상의 외연이 그만큼 넓어집니다.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려면 이 넓어진 외연을 진정성 있게 끌어안아야겠지요. 소비자가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