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불멸의 트렌드
Cheil Magazine 2019. 2
편집실
‘하면 좋은 것’이었던 친환경 소비가 최근에는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환경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기업들은 리브랜딩 효과를 얻기도 한다. 물론 소비자들은 그냥 ‘관심 있는 척’ 하는 기업과 진정성을 갖고 진심으로 동참하는 기업을 구분할 줄 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몇 권의 책들을 살펴보자.

누구나 쓰레기를 ‘생산’한다
“최근 플라스틱과 각종 공산품 쓰레기를 줄이자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 언뜻 나와 무관한 뉴스처럼 들린다. 하지만 마트에 가면서 지갑과 함께 장바구니를 챙겨 가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현실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제로 웨이스트 운동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자신이 생산한(?) 쓰레기를 분석해 소비 습관을 개조하면 자연이 덜 훼손된다는 생각의 실천일 뿐이다. 그렇다면 나와 내 이웃들은 왜 이런 대단히 귀찮은 실천을 자발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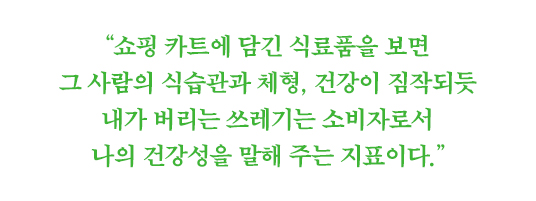
봄이 침묵 한다면?
얼마 전, 코에 빨대가 꽂힌 바다거북이 발견돼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이 참혹한 비주얼은 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을 외치는 웅변이 됐고,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노 플라스틱’을 선언하고 나섰다. 스타벅스는 2020년까지 전 세계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했고, 나이키와 H&M, 버버리 등의 브랜드들은 원료와 제품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줄이는 ‘메이크 패션 서큘러’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 장의 사진이나 비디오클립이 대중의 인식을 전환시키기도 하지만, 얇은 책 한 권이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살충제와 제초제, 다양한 살균제가 인간과 세상을 이롭게 할 ‘기적의 화학 물질’로 받아들여졌던 1960년대, 작가의 꿈을 포기한 해양생물학자 레이첼 카슨은 『침묵의 봄』이라는 도발적 제목의 책을 펴냈다.
▲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소개 영상
만물과 공유해야 하는 지구를 마치 주인처럼 독점하고 독식하기 위해 무모하고 무책임하게 오염시키는 인간의 질주에 제동을 건 것이다.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적 인식에 불을 붙이고, 정부의 정책 실현을 이끌어 낸 이 책은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책으로 일컬어진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4월 22일 ‘지구의 날’ 제정에도 기여한 이 책이 출판된 시점이 1962년, 즉 20세기 중반이라는 사실이다.
지구의 절반을 양보하라
그로부터 6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는 레이첼 카슨의 우려와 경고, 즉 “침묵의 봄은 왔는가, 아니면 오지 않았는가”란 질문지를 받아 들고 있다.

그의 책은 무분별한 화학 약품 생산에 제동을 걸었고, 정책적 안전 장치를 만들었다. 그로 인해 최소한 침묵의 봄이 늦춰지는 효과는 봤다. 그렇다고 해서 새가 울지 않는 ‘침묵의 봄’이란 재앙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반성과 실천을 통해 다가올 재앙을 막아야 하는 것일까? 20세기의 대표적 과학 지성으로 불리는 에드워드 윌슨은 『지구의 절반』이란 책 제목 자체로 자신의 제안을 명확하게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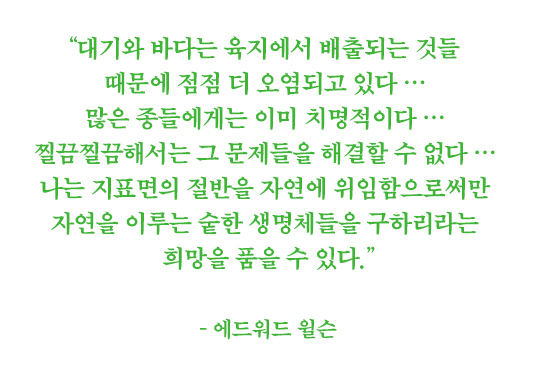
삼한사온 대신 찾아온 삼한사미
인간들에게 지구의 절반에서 손을 떼라는 윌슨의 주장이 비현실적이고 허황된 학자의 이상에 불과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19세기에 월든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2년 남짓 거주했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고전 『월든』을 읽은 뒤에도 우리는 반성하지도 실천하지도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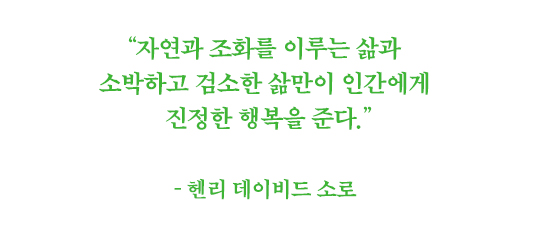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인간은 지구상에서 자연을 해치는 유일한 생명체다. ‘삼한사온(三寒四溫)’의 겨울 대신 ‘삼한사미’의 계절을 지내야 하는 게 결코 에일리언의 탓은 아니다. 트렌드조차 빨리 소비해 버리는 성향이 제로 웨이스트에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지속가능한 자연을 위해 이 트렌드는 영구히 지속돼야 한다. 베란다에 잔뜩 쌓인 플라스틱 용기들은 퇴근 후 내다 버려야 할 ‘쓰레기’가 아닌 집 안에 덜 들여놓아야 할 ‘기피 대상’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