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서 왔든, 금성에서 왔든
Cheil Magazine 2017. 11
글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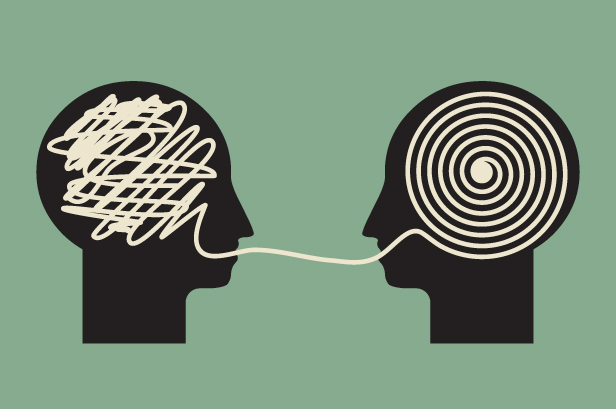
차라리 반가운 우리 시대의 어젠다
인류사는 ‘대결’의 연속이었다. 종교가 그랬고, 민족이 그랬으며, 계급이 그래 왔다. 그 와중에 유독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대결이 있다. 바로 ‘젠더’의 대결이다. 여성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가장 빠른 시기가 1893년 뉴질랜드에서다. 인류의 오랜 역사에 비춰볼 때 이 정도면 여자들이 많이 참은 편 아닐까.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조차 그랬으니, 불과 20년 전만 해도 택시기사가 ‘첫 손님이 안경 쓴 여자’라면 당당하게 승차 거부를 했던 우리의 사정이야 오죽하랴.
프랑스의 곤충학자 파브르에게 헌정하는 것도 아닐 텐데, 요즘 온라인에는 ‘충(蟲)’을 접미사로 하는 신조어가 자주 보인다. 이런 신조어들이 게시판을 달구는 모습을 보면 너무 과격한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논쟁이 공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다행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여성들이 아예 입조차 열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으니 말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논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건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는 청신호일 수도 있다. 논쟁이 있어야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은가.
뉴욕타임스는 왜 그랬을까?
레베카 솔닛의 책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진 단어가 있다. 바로 ‘맨스플레인(Mansplain)’이다. 여자들은 잘 모를 거라는 전제 하에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드는 남자를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뉴욕타임스」는 2010년 이 신조어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고, 2014년에는 온라인 옥스퍼드 사전에도 올라갔다. 뉴욕타임스는 왜 맨스플레인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을까?
언어는 새로 태어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언어의 특성에 대해 배운 적이 있을 것이다. 맨스플레인은 ‘언어의 창조성’에 속한다. 그런데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하이데거의 말처럼 언어가 생성되고 소멸하는 과정에는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반영된다.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언어는 요절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불로장생할 수도 있다.
올해의 단어 선정은 맨스플레인이 ‘실체 없는 허깨비’가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남성은 결코 여성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들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는 남성들만의 금과옥조가 아니다. 남자가 화성에서 왔든, 여자가 금성에서 왔든 스타워즈를 방불케 하는 대결은 소모적이다. 결국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적 동물은 상대에 대한 배려와 이해 없이는 행복해지기 어렵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