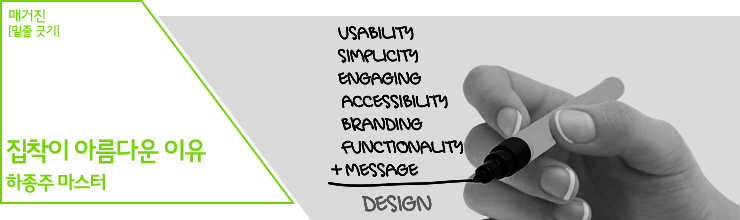
나는 지난해 사내 행사로 진행됐던 ‘사일런트(Silent) 콘서트’ 포스터를 참 좋아한다.
관객들이 무선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콘서트라 타이틀이 ‘사일런트 콘서트’.
나는 이 독특한 콘서트를 알리는 포스터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사일런트’라는 콘셉트에 주목했다.
그래서 보일 듯 말 듯 오선지를 그려 넣고는 살짝 바니시(광택) 작업만 추가했다.
이 포스터는 멀리서 보면 그냥 빈 종이처럼 보인다.
나는 과제가 주어지면 통상적으로 나와 있는 답안은 일단 제쳐 놓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다.
설령 결국은 일반적 방법으로 ‘유턴’하게 될지라도 쉬운 방법을 향해 ‘직진’하지는 않는다.
유니크한 솔루션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풀어내려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만의 ‘유레카’를 고집하는 건 아니다.
커머셜 아트는 클라이언트라는 방정식이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서 첫 직장을 얻었을 때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내부에서는 다들 멋진 디자인이라고 좋아했지만, 정작 클라이언트가 시큰둥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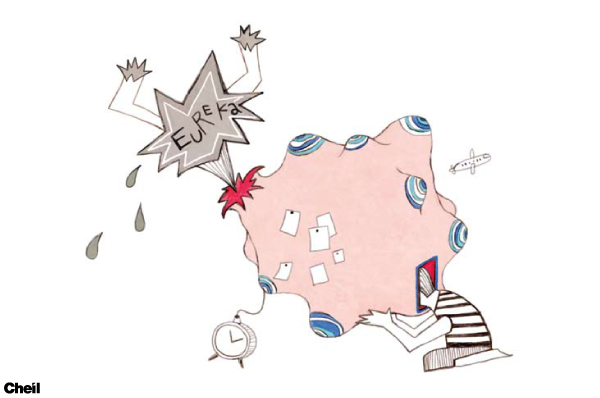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디자이너가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을 망각하고, 자신의 디자인에 도취됐기 때문이다.
커머셜 아트의 핵심은 커뮤니케이션에 있는데 그걸 담아내지 못하는 디자인은 의미가 없다.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디자인이면 뭐 하는가, 상대방이 찾는 대답이 아닌 것을.
그런데도 고집을 부린다면 그건 고집이 아니라 아집이다. 스타일에 함몰되지 말아야 한다.
디자이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시각적 방법으로 찾는 사람들이지 외양을 꾸미는 스타일리스트가 아니다.
경험이 부족한 디자이너들은 가끔 그런 함정에 빠지곤 한다.
그러고 보면 디자이너는 멀티태스커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
AE(account executive)는 아니지만 AE의 눈으로 문제를 봐야 한다.
얼마 전 나는 프로보노의 일환으로 포도 식초 패키지 디자인 작업을 했다.
그 포도 식초는 고가의 퀄리티 높은 제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진가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평범한 패키지가 원인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패키지 디자인이 아니라 브랜드 스토리를 만드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고,
자연주의 농법을 콘셉트로 스토리를 구성했다.
그런 연후에 스토리를 가장 잘 표현하는 비주얼을 찾아서 패키지를 만들었다.
생각하지 않는 디자이너에게 좋은 디자인이 나올 리 없다.
디자이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디자인은 그 다음이다.
그래서 나는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라는 말을 무척 싫어한다. 디자이너는 제품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이 제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지,
소비자와 어떤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지 등을 고민해 해결책을 내놓는 사람이다.
물론 문제 해결이 전부는 아니다. 심미적으로 아름답고, 기능적으로 효율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디자이너는 참 어려운 직업이다.
후배들에게 한 가지 귀띔해 주고 싶은 건 다양한 경험을 쌓으라는 거다.
여행도 많이 다니고, 책도 많이 읽어야 한다.
책도 디자인과 관련된 책만 편협하게 읽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책을 접하도록 하자.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면 어느 순간 멋진 아이디어가 불쑥 튀어나온다.
좋은 솔루션은 책상 앞에 앉아 사흘 낮밤을 고민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다.
차곡차곡 쌓인 감성과 지식의 그물이 물고기를 낚아 올린다.
실제로 주변을 돌아보면 다방면으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솔루션을 잘 낸다.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좋은 솔루션을 내는 데 ‘집착’만큼 좋은 도구가 없다.
나는 물건을 까다롭게 고르는 편이다. 열쇠고리나 자루걸레처럼 아무리 사소한 물건이라도
내 마음에 딱 들지 않으면 구입하는 데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다.
한번은 전자레인지와 전기밥솥을 사러 간 적이 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전자레인지는 하나같이 꽃무늬, 전기밥솥은 하나같이 헬멧처럼 동글동글한 모양이 아닌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둥그런 게 있으면 네모난 것도 있고, 길쭉한 것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걸 디자인한 사람들은 소비자를 충분히 생각했던 건가?’하는 의구심까지 들었다.
가끔은 이런 까탈스러움이 나 자신을 힘들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집착이 직업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한다.
자, 보자. 예산이 충분한 프로젝트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항상 모자란다. 아니,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다.
시간도 부족하다. 우리는 항상 그런 열악한 조건 안에서 베스트 솔루션을 내야 한다.
그러니 집착을 할 수밖에 없다.
엔드 유저들은 결과물만 보고 이게 뭐야 할지도 모르지만, 한정된 조건 속에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수십 수백 번의 고민이 필요하고, 디테일에 대한 강도 높은 집착이 필요하다.
그래야 완성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피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웬만하면 그쯤에서 끝내도 될 것을, 나는 조금 더 좋은 게 없나 두리번거리며 극성을 떨기 때문이다.
하지만 짜내야 한다. 집착해야 한다. 그러면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다. 그게 집착이 아름다운 이유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