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치마킹이란 단어가 화두일 때가 있었다.
남의 것을 연구하고 배워서 우리 것에 쓸모 있게 접목하자는 의미였다. 2000년대 초반부터 대한민국 기업들이 본격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모든 업무 프로세스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고, 각 산업군별로 이른바 해외에서 잘나간다는
기업, 부서를 연구하기 바빴다. 광고계에서도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로 트렌드를 이끌던 CP+B, 위든 앤 케네디(Weiden & Kennedy),
오길비(Ogilvy), TBWA, BBDO 같은 글로벌 대행사의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360도 브랜드 스튜어드십(360 Degree Brand Stewardship)이니 디스럽션(Disruption)이니 하는 글로벌 대행사들의 철학이 암송해야
할 키워드로 부상했다. ‘어디서 무슨 광고를 만들었어!’라는 소문이 뜨거운 뉴스였고 실체 이상으로 그들의 작업이 대단한 것인 양
부풀려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의 국내 취업도 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 함량 미달인 사람들이 꽤 됐다. 황인종이 아니고 영어를 잘 구사하며 글로벌 대행사의 경력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일자리를 구해 들어올 수 있었다. 단숨에 글로벌화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수순이라는 말도 주변에 나돌곤 했다. 글로벌이란 수능 고득점 대비를 하듯 밑줄치고 외워야 하는 것처럼 생각되던 시절이었다. 그러한 양상은 우리가 세계 유수의 광고제에서 수상 실적도 미미했고 전략과 크리에이티브가 기준점을 밑돌 때의 패러다임이었다.
그러나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불과 3, 4년 사이에 대한민국 광고계는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를 응원하러 경기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선수로 뛰기 위해 경기장에
들어서는 횟수가 잦아졌다. 글로벌 대행사들과의 경쟁 PT에서 맞붙기도 하고 칸과 같은 국제광고제에서 일본을 앞지르는 수상 실적을
보이며 숨겨진 영웅본색의 카리스마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월드컵 축구 우승이 빠를까 칸 크리에이티비티 페스티벌 그랑프리 수상이
먼저일까를 점친다면 월드컵 우승이 먼저일거라는 사실에 쉽게 동의하던 분위기가 한 번에 역전됐다.
그러나 여전히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한 저변은 약한 편이며 해외의 명망 있는 선수들과 어깨를 맞댈 기회를 갖는 것도 일부 광고사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벤치마킹이란 단어가 주변에서 맴돌고 있다.
언급되는 대행사만 Google Creative Lab, AKQA, R/GA, Droga5, 72 and Sunny 등 디지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비관습적인
접근법에 능한 신흥 광고사로 바뀌었을 뿐 그들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논조에는 변함이 없다. 관습에 젖은 탓이라고 치부하기엔
작금의 상황은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여전히 쏟아 놓는다는 것은 상황이 얼마나 촉박한지를, 작금의 광고 환경이
얼마나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을 방증하는 예일 뿐이다.
이젠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작년까지 유행했던 QR코드도 올해엔 아주 낡은 기술로 치부되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그것의 빠른 일상생활로의 접목이 이뤄짐에 따라 듣지도 보지도 못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들이 해마다
쏟아져 나온다. 벤치마킹만 하다간 뭐 하나 제대로 이뤄보지도 못하고 머리가 하얗게 샐 것이다.
지금 현업에선 위에 언급된 신흥 강호들과 글로벌 PT를 하고 있다.
그들을 배워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무찌를 필살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지금이야말로 전략에서, 크리에이티브에서 그들을 능가할 벤처 정신에 충만해 있어야 할 때다.
한때 벤처 열풍이 불어 대한민국 청년 기업가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로 기업을 설립하겠다는 야망의 시절이 있었지만,
그 때도 광고산업은 페이드 미디어(Paid Media)에 광고 콘텐츠를 실어 나르는 일만 반복했었다.
이제 그 벤처 정신이 광고계에 널리 퍼져야 할 때다.
이미 제일기획은 테스코 가상 매장이나 이마트 그림자 OR코드 같은 디지털 기술에 입각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새로운 구매
형태를 창출해 냈고, 그로 인해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전 세계에 전파한 바 있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은 마포대교 생명의 다리, 이마트 세일즈 내비게이션, 던킨도너츠 모닝스타트업 캠페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언팩(Unpacked)과 같은 전 세계 모바일 마케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도 생성해 내고 있다.
이제 우리는 광고 대행사란 이름을 버리고 통합 솔루션 컴퍼니(The Integrated Solution Company)로 머천다이징 컴퍼니
(The Merchandising Company)로 진화해야 한다.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속도가 더디다. 광고 대행사란 클라이언트가 광고 제작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해 주로 4대 매체를 중심으로 광고 제작만을
대행으로 맡기던 시절의 얘기다. 그 패러다임에선 글로벌화를 위해 벤치마킹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벤 벤치마킹의 낡은 패러다임은 버려야 한다.
우리 스스로 벤처가 돼야 한다. 벤처에 기반한 새로운 플랫폼들이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게 하고,
이젠 다른 이들이 우리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우리 고유의 벤처 마켓을 형성해야 한다.
아직 많이 모자라지만, 우리는 그 정도 값을 할 만큼은 성장했다.
이제 주변에서 ‘누구를 벤치마킹하자’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의 AKQA도 R/GA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일 뿐이다. 우리만이 구현할 수 있는 높은 퀄리티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필살기로 무림에 나서야 한다.





 hongtack@samsung.com "메일보내기"">
hongtack@samsung.com "메일보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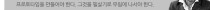



댓글